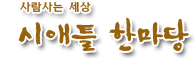소 잃고 정 잃은 마을의 ‘무거운 침묵’
페이지 정보

본문
안동시 명잦마을은 ‘구제역 진원지’로 알려진 서현리의 옆 동네, 소 600여 마리를 살처분한 뒤 이 마을에서는 이웃 간 왕래와 사는 즐거움이 사라졌다. 지하수 걱정, 보상금 걱정인 마을을 둘러봤다.
경북 안동시 와룡면 명잦마을. 행정구역상 감애리·태리·주하리 등이 뒤섞여 있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명잦마을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300년도 더 된 이 부락에 옛날에는 목화가 가득했다고 마을 원로 이중구씨(76)는 회상했다. 마을 이름 ‘명잦’은 목화로 짠 옷감을 일컫는 안동의 방언 명자치에서 왔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화는 사라졌고 그 자리를 소가 채웠다. 안동시의 한우 육성 정책과 함께 명잦마을에도 소 울음소리가 커졌다. 적어도 지난해 12월1일까지는 그랬다. 구제역 재앙이 터지면서 마을에서는 더 이상 소 울음을 들을 수 없다.
사단은 지난해 11월29일 옆 동네 서현양돈단지에서 일어났다. 그곳에서 키우던 돼지들이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것. 서현양돈단지 인근 3㎞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잦마을 사람들은 적게는 1마리부터 많게는 92마리까지 마을 앞 공터에 소를 묻어야 했다. 마을의 모든 소를 예방적 살처분해야 한다는 정부 조처에 따라야 했다(이후 조사에서 몇몇 집은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 집 앞에는 ‘구제역 발생 출입금지’라는 빨간 표지가 아직까지 붙어 있다).
소를 키우던 17가구는 2주일간 바깥 출입을 못했다. 구제역 바이러스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우 65마리를 묻은 김금자씨(61)도 ‘작은 마을에 군인도 오고, 공무원도 와서 전쟁터 같았던 살처분 날’을 보내고 한 달 가까이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방역당국의 당부도 있었지만, 괜스레 밖에 나갔다가 구설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집 밖에 나가지 않으니 식탁 메뉴는 늘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였다. 냉장고에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있었지만 죽어간 소들이 떠올라 쳐다보지도 않았다. 애꿎은 소를 잃은 몇몇 사람은 마을 소가 가장 많이 묻힌 감애리 691-3번지에서 ‘간이 제사’를 지냈다. 오징어 한 축과 막걸리를 들고 543마리가 묻힌 땅에 대고 연방 머리를 조아리며 나름의 푸닥거리를 했다.
구제역 후유증은 소 키우던 집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번졌다. 먼저 이웃 간에 대화가 사라졌다. 권오석 명잦마을 이장은 “서로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깐 조심스러워했다. 이야기하기를 거북해하다보니 이웃 간에 교제가 뚝 끊겼다. 이런 적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구제역 이후, 마을 사람 전체가 모이는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서현리의 ‘네 탓 공방’ 보며 침묵 더 깊어져
구제역 발생지 서현리에서 벌어지는 ‘네 탓 공방’을 지켜보며 주민들은 더욱 입을 다물었다. 방역 당국이 전국으로 퍼진 구제역 원인으로 베트남을 다녀온 서현리 한 양돈단지의 주인 권기택씨를 지목했고, 그 전에 같은 양돈단지의 양 아무개씨가 병든 돼지를 무단으로 묻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으로 서현리 전체가 홍역을 앓았다. 결국 매몰된 양씨의 돼지를 파내 구제역 검사를 했으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 권씨 또한 최근 구제역 바이러스가 베트남에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 한숨을 돌린 상태이지만, 논란을 지켜보던 명잦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소 잃고 인심도 잃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음도 끊겼다. 명잦마을의 또 다른 특산품 마는 겨울이 제철이라 농사를 마무리 짓고 도시로 상품을 보내야 했지만 택배 기사들이 마을에 들어올 수 없었다. 주민들은 할 수 없이 마를 직접 차에 실어 중간 장소에서 택배 기사와 만났다. 경조사 참석은 전화와 계좌이체로만 대신했다. 주민 이상목씨(49)는 “시골이 도시랑 다른 점은 이웃 간의 정인데 그게 없어진 것 같다. 지나가다 옆집에 들러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같이 해먹고 그랬는데 한동안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말했다. 명잦마을은 빠른 속도로 얼어붙었다. 구제역이 잡히지 않고 갈수록 전국으로 더 번지면서 ‘정신 문화의 수도 안동’을 ‘구제역 진원지’로 지탄하는 목소리를 꼼짝없이 들어야만 했다.
그 와중에도 봄은 어김없이 왔다. 2월16일 안동시는 가축 이동 제한을 풀었다. 안동에서 마지막으로 소·돼지를 살처분한 지 한 달이 넘었고, 마지막 구제역 2차 예방접종이 끝난 것도 열흘이 지나서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판단에서다. 마을 사람들도 봄맞이에 들어갔다. 기자가 명잦마을을 찾은 2월23일 오전에는 대다수 집이 비어 있었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황재석씨(61)는 “다들 시내에 볼일을 보러 갔거나 밭에 나갔을 것이다.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벼농사를 지어 나락을 소여물로 주고 소의 분뇨를 땅 거름으로 주는 순환농법은 한동안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벼·마·고추 등을 키울 준비를 했다.
걱정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다. 포근해진 날씨와 함께 언 땅이 녹으면서 2차 환경오염 문제가 자연스레 마을의 화두로 떠올랐다. 공동 매몰지의 파이프에는 유기물이 차 있었다. 지하수를 마시는 명잦마을 사람들도 언론에서 매일 침출수에 대해 보도하니 관심이 안 갈 수 없다고 했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80~90대 노인 네 명에게 지하수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걱정이라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한 노인은 “시에서 여름쯤에 상수도를 만들어준다 카는데, 물은 만날 마시는 거 아이가. 그 전에 일 나뿌면 우야노(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전국의 구제역 피해 농장 모두 6116곳
마을 사람들의 또 다른 관심사는 보상이다. 명잦마을은 살처분 당시 보상과 관련해 한 차례 소동이 있었다. 주민들은 보상가에 항의하며 구제역 방제단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구제역이 일어났을 때 시세로 매몰 보상비를 책정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반발하며 구제역 발생 전 일주일 동안의 평균단가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소 69마리를 살처분한 김세호씨(48)는 “소 10마리로 시작해 10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늘린 목장이다. 그것을 아무 잘못 없이 하루아침에 잃었다. 100% 보상을 다 받아도 예전처럼 재기하는 데 그동안 쏟아 부은 10년만큼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마을 주민들은 답답한지 “기자 양반은 이번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느냐?”라는 말을 여러 번 꺼냈다. 50% 선지급받은 보상금을 사료와 트랙터를 사고 우사를 새로 짓기 위해 들어간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입식(축사에 소를 들이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남은 보상금이 들어와야 다시 소를 들일 수 있다고 했다. 구제역이 다시 일어날까봐 겁이 나서 예비 입식으로 한두 마리를 축사에 들여보고 수를 늘리겠다는 사람은 있어도 축산을 포기하겠다는 이는 기자가 만난 사람 중에는 없었다. 축산업에 미래가 없다는 여당 원내대표의 말이 이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 듯했다. 한 농민은 “사람 죽어도 사는데, 소 죽었다고 못 살겠나. 한동안 힘들었지만 털고 일어나야지. 시간이 약이다”라고 말했다.
3월7일이면 구제역 발생 100일이 된다. 2월24일 현재 전국에 350만 마리가 넘는 소·돼지가 묻혔다. 구제역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국의 매몰지는 4435여 곳, 구제역 피해를 당한 농장만 6116곳이다. 구제역으로 삶과 주변 환경이 붕괴된 게 명잦마을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마을은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었지만, 이것이 농촌 전반을 덮칠 ‘봄의 침묵’의 서곡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마을을 나서면서도 지워지지 않았다.
출처: 시사인
경북 안동시 와룡면 명잦마을. 행정구역상 감애리·태리·주하리 등이 뒤섞여 있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명잦마을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300년도 더 된 이 부락에 옛날에는 목화가 가득했다고 마을 원로 이중구씨(76)는 회상했다. 마을 이름 ‘명잦’은 목화로 짠 옷감을 일컫는 안동의 방언 명자치에서 왔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화는 사라졌고 그 자리를 소가 채웠다. 안동시의 한우 육성 정책과 함께 명잦마을에도 소 울음소리가 커졌다. 적어도 지난해 12월1일까지는 그랬다. 구제역 재앙이 터지면서 마을에서는 더 이상 소 울음을 들을 수 없다.
사단은 지난해 11월29일 옆 동네 서현양돈단지에서 일어났다. 그곳에서 키우던 돼지들이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것. 서현양돈단지 인근 3㎞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잦마을 사람들은 적게는 1마리부터 많게는 92마리까지 마을 앞 공터에 소를 묻어야 했다. 마을의 모든 소를 예방적 살처분해야 한다는 정부 조처에 따라야 했다(이후 조사에서 몇몇 집은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 집 앞에는 ‘구제역 발생 출입금지’라는 빨간 표지가 아직까지 붙어 있다).
 |
||
|
ⓒ시사IN 백승기 구제역 첫 발생지로 의심되는 마을 옆에 있다는 이유로 동네 소를 모두 살처분한 경북 안동시 와룡면 명잦마을은 썰렁했다. | ||
소를 키우던 17가구는 2주일간 바깥 출입을 못했다. 구제역 바이러스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우 65마리를 묻은 김금자씨(61)도 ‘작은 마을에 군인도 오고, 공무원도 와서 전쟁터 같았던 살처분 날’을 보내고 한 달 가까이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방역당국의 당부도 있었지만, 괜스레 밖에 나갔다가 구설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집 밖에 나가지 않으니 식탁 메뉴는 늘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였다. 냉장고에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있었지만 죽어간 소들이 떠올라 쳐다보지도 않았다. 애꿎은 소를 잃은 몇몇 사람은 마을 소가 가장 많이 묻힌 감애리 691-3번지에서 ‘간이 제사’를 지냈다. 오징어 한 축과 막걸리를 들고 543마리가 묻힌 땅에 대고 연방 머리를 조아리며 나름의 푸닥거리를 했다.
구제역 후유증은 소 키우던 집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번졌다. 먼저 이웃 간에 대화가 사라졌다. 권오석 명잦마을 이장은 “서로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깐 조심스러워했다. 이야기하기를 거북해하다보니 이웃 간에 교제가 뚝 끊겼다. 이런 적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구제역 이후, 마을 사람 전체가 모이는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서현리의 ‘네 탓 공방’ 보며 침묵 더 깊어져
구제역 발생지 서현리에서 벌어지는 ‘네 탓 공방’을 지켜보며 주민들은 더욱 입을 다물었다. 방역 당국이 전국으로 퍼진 구제역 원인으로 베트남을 다녀온 서현리 한 양돈단지의 주인 권기택씨를 지목했고, 그 전에 같은 양돈단지의 양 아무개씨가 병든 돼지를 무단으로 묻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으로 서현리 전체가 홍역을 앓았다. 결국 매몰된 양씨의 돼지를 파내 구제역 검사를 했으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 권씨 또한 최근 구제역 바이러스가 베트남에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 한숨을 돌린 상태이지만, 논란을 지켜보던 명잦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소 잃고 인심도 잃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음도 끊겼다. 명잦마을의 또 다른 특산품 마는 겨울이 제철이라 농사를 마무리 짓고 도시로 상품을 보내야 했지만 택배 기사들이 마을에 들어올 수 없었다. 주민들은 할 수 없이 마를 직접 차에 실어 중간 장소에서 택배 기사와 만났다. 경조사 참석은 전화와 계좌이체로만 대신했다. 주민 이상목씨(49)는 “시골이 도시랑 다른 점은 이웃 간의 정인데 그게 없어진 것 같다. 지나가다 옆집에 들러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같이 해먹고 그랬는데 한동안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말했다. 명잦마을은 빠른 속도로 얼어붙었다. 구제역이 잡히지 않고 갈수록 전국으로 더 번지면서 ‘정신 문화의 수도 안동’을 ‘구제역 진원지’로 지탄하는 목소리를 꼼짝없이 들어야만 했다.
그 와중에도 봄은 어김없이 왔다. 2월16일 안동시는 가축 이동 제한을 풀었다. 안동에서 마지막으로 소·돼지를 살처분한 지 한 달이 넘었고, 마지막 구제역 2차 예방접종이 끝난 것도 열흘이 지나서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판단에서다. 마을 사람들도 봄맞이에 들어갔다. 기자가 명잦마을을 찾은 2월23일 오전에는 대다수 집이 비어 있었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황재석씨(61)는 “다들 시내에 볼일을 보러 갔거나 밭에 나갔을 것이다.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벼농사를 지어 나락을 소여물로 주고 소의 분뇨를 땅 거름으로 주는 순환농법은 한동안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벼·마·고추 등을 키울 준비를 했다.
 |
||
|
ⓒ시사IN 백승기 소들이 사라진 텅 빈 축사는 마을보다 더 을씨년스러웠다. | ||
걱정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다. 포근해진 날씨와 함께 언 땅이 녹으면서 2차 환경오염 문제가 자연스레 마을의 화두로 떠올랐다. 공동 매몰지의 파이프에는 유기물이 차 있었다. 지하수를 마시는 명잦마을 사람들도 언론에서 매일 침출수에 대해 보도하니 관심이 안 갈 수 없다고 했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80~90대 노인 네 명에게 지하수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걱정이라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한 노인은 “시에서 여름쯤에 상수도를 만들어준다 카는데, 물은 만날 마시는 거 아이가. 그 전에 일 나뿌면 우야노(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전국의 구제역 피해 농장 모두 6116곳
마을 사람들의 또 다른 관심사는 보상이다. 명잦마을은 살처분 당시 보상과 관련해 한 차례 소동이 있었다. 주민들은 보상가에 항의하며 구제역 방제단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구제역이 일어났을 때 시세로 매몰 보상비를 책정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반발하며 구제역 발생 전 일주일 동안의 평균단가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소 69마리를 살처분한 김세호씨(48)는 “소 10마리로 시작해 10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늘린 목장이다. 그것을 아무 잘못 없이 하루아침에 잃었다. 100% 보상을 다 받아도 예전처럼 재기하는 데 그동안 쏟아 부은 10년만큼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마을 주민들은 답답한지 “기자 양반은 이번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느냐?”라는 말을 여러 번 꺼냈다. 50% 선지급받은 보상금을 사료와 트랙터를 사고 우사를 새로 짓기 위해 들어간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입식(축사에 소를 들이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남은 보상금이 들어와야 다시 소를 들일 수 있다고 했다. 구제역이 다시 일어날까봐 겁이 나서 예비 입식으로 한두 마리를 축사에 들여보고 수를 늘리겠다는 사람은 있어도 축산을 포기하겠다는 이는 기자가 만난 사람 중에는 없었다. 축산업에 미래가 없다는 여당 원내대표의 말이 이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 듯했다. 한 농민은 “사람 죽어도 사는데, 소 죽었다고 못 살겠나. 한동안 힘들었지만 털고 일어나야지. 시간이 약이다”라고 말했다.
3월7일이면 구제역 발생 100일이 된다. 2월24일 현재 전국에 350만 마리가 넘는 소·돼지가 묻혔다. 구제역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국의 매몰지는 4435여 곳, 구제역 피해를 당한 농장만 6116곳이다. 구제역으로 삶과 주변 환경이 붕괴된 게 명잦마을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마을은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었지만, 이것이 농촌 전반을 덮칠 ‘봄의 침묵’의 서곡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마을을 나서면서도 지워지지 않았다.
출처: 시사인
관련링크
- 이전글세계 여성의 날과 고 장자연 씨 11.03.08
- 다음글자칭 군개혁 전문가 이상우 교수의 궤변에 대한 반론 11.03.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