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편소설] 대지의 딸 3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산 작성일 22-02-01 04:50 조회 12,001 댓글 0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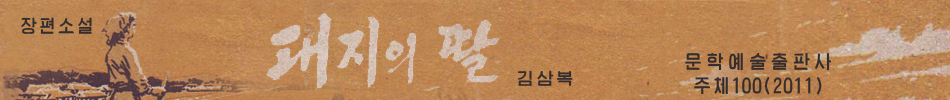
제 4 장
생활은 앞으로
35
하루는 5작업반장 마장석이 오만수로인을 작업반으로 불렀다.
《마장석반장이 나를 찾을 까닭이 없겠는데?》
데리러 온 작업반 통계원녀인을 의심쩍게 바라보며 오만수가 물었다. 하긴 한마을에 같이 살기는 해도 오만수는 로력자가 아니고 어느 작업반에도 속해있지 않으니 5반장이 오라가라할 까닭이 없다.
《난 모르겠어요. 관리위원회 갔다오는 길로 나더러 할아버지를 모셔오라더군요.》
《마반장네 집에서 무슨 대사를 치르나?》
《호호… 아니예요.》
《좋다, 하여튼 가자.》
어두웠지만 마을의 골목골목을 손금보듯 알고있는 오만수는 앞장서서 씽씽 걸었다. 원체 건강하기도 했거니와 마장석이 왜 찾는지 무척 궁금했던것이다.
바깥바람을 맞으며 오느라 눈가장자리가 불기우리하고 눈물이 질척해진 오만수는 작업반사무실에 들어서기 바쁘게 기다리고있는 마장석에게 가느다란 고음으로 소리치듯 하였다.
《마반장이 무슨 권한으루 나를 부르나?》
롱을 잘하는 로인의 성미를 알고있는 마장석은 웃지도 않고 되물었다.
《저녁진지를 잡수셨습니까?》
《아직 식전이야.》
《좌우간 좀 앉으시우.》
《그래, 앉지.》
오만수는 어험어험하며 마장석의 앞에 올방자를 틀고앉았다.
《한대 피우시오.》
《그러지.》
《령감님, 일감이 생겼어요.》
《일감? 내게 무슨 일감이 생겨?》
담배를 받아든 오만수는 마장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관리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관리위원장이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작업반들에서 소를 책임적으로 먹이지 않아 소들이 여윈것이 적지 않는데 이건 소먹이는것을 중시하지 않고 로력공수를 적게 주며 농사일도 하면서 겸해서 소도 먹이게 하도록 하고있기때문이라고 관리위원장이 말합데다. 옳은 소리지요. 그래서 소를 전문 맡아 먹이고 로력공수도 잘 먹이는데 따라 높이 주자는건데 농장원을 떼낼수는 없으니까 령감님처럼 나이는 들어 집에서 놀고있지만 오륙이 성성한 늙은이들한테 소들을 맡기자는겁니다. 잘 생각했지요. 만수령감님이 집에서 빈들거리지는 않고 집짐승들을 먹이고있긴 하지만 그 열성을 농장일에 바치면 좋지 않겠습니까? 소도 살이 지고 령감님이 로력공수도 벌고, 어떻습니까?》
오만수는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그걸 관리위원장이 제안했나?》
《예, 벌써 수첩에다가 만수령감님 같은 늙은이들의 이름까지 적어넣어가지고있습니다. 어느 작업반엔 누구누구하고 말이요. 만수령감이야 5작업반마을에 사니까 응당 우리 작업반 소를 맡아야지요. 관리위원장의 수첩에도 그렇게 올라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위원장이 나더러 5작업반의 소를 먹이도록 했겠군?》
《예, 그런데 의무적으로 동원시키지 말고 본인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좋다고 하면 맡기라고 했습니다.》
오만수가 무릎을 툭툭 쳤다.
《그 참!》
《왜 그러십니까?》
《관리위원장이 참 좋은 궁냥을 했어! 일을 하자는 사람이니까 좋은 궁냥이 자꾸 생기지. 난 그 내인을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나누어보면서 장차 큰일을 할 재목이구나, 우리 잠정리에 운이 틀게야 하고 앞을 내다보았댔네.》
마장석이 허허 웃었다.
《왜 웃나?》
《그건 방금 지어낸 얘기지요? 령감님이 그처럼 선견지명이 있다면야 관리위원장은 몰라두 작업반장쯤은 했을거요. 한데 평생 분조장두 못해봤지요?》
오만수는 얼굴이 벌겋게 되였다.
《늙은이를 놀려대면 못쓰네. 임잔 젊은 사람이 늘 봐야 버릇이 없어.》
《하! 내가 몇살인지 압니까? 쉰고개를 훨씬 넘었어요.》
《나보다 20년 아래군.》
《좋수다. 젊은 사람이라니 듣기 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얼?》
《소 먹이는것 말입니다.》
《이 사람아, 관리위원장이 내 이름을 수첩에 올렸는데 무슨 군소리 있겠나? 이 오만수가 늙었으니 아주 줴버린줄 알았는데 불러주구 써주지 않나!》
《예, 좋습니다.》
그후 오만수 같은 로인들이 관리위원회로 불리워왔다. 오만수로인이 나이가 그중 많지만 제일 건강하고 좌상다운 체모가 있어 이들의 책임자로 선정되였다. 그는 큰 벼슬이나 하게 된것처럼 틀을 차리며 연방 어험어험 소리를 냈다.
관리위원회가 취한 조치는 뜨락또르에만 매달리면서 소를 홀시하는 경향을 없애고 소를 적극 작업에 인입하게 한 정당한 조치로서 농장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오만수는 외양간을 정비하고 마치 자식을 돌보듯 황소를 다루었다. 새벽잠이 없기도 했지만 갑자기 부지런해져서 늘 일찌기 일어나 물을 떠다가 황소한테 먹인다. 그리고 소여물을 끓인다. 부엌에 여물냄새가 꽉 찬다. 로인은 흰 김이 문문 나는 여물을 바께쯔에 퍼담아가지고 외양간으로 향한다. 황소는 목에 매단 방울을 절렁거리며 여물통에 주둥이를 들이민다. 로인은 구수한 소냄새와 여물냄새에 취한듯 소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오래 서있는다.
날이 밝았다. 청명한 가을날씨다. 하늘은 깨끗하게 개이였다. 방금 떠오르는 해볕에 동녘이 불그레하게 물들었다. 날씨는 쌀쌀하고 대기는 투명했다. 터밭에서 자라고있는 배추와 무우잎사귀들이 이슬에 축축하게 젖었다. 대기속에 슴슴한 물냄새와 이슬에 젖은 백일홍과 코스모스의 향기, 외양간과 풀적재장에서 나는 두엄냄새가 짙게 풍기였다.
오만수로인은 싸리비자루로 황소의 등과 옆구리, 배를 쓸어주고 물로 씻어줄데는 물로 씻어준 다음 닭장으로 가서 닭들을 내놓아주었다. 울긋불긋한 토종닭들이 꼬꼬댁거리며 마당에 가득 널리였다.
손자가 방문을 열고 《할아버지, 진지 잡수시래요.》 하고 찾을 때까지 그는 마당에서 서성거리였다.
로인은 아침식사를 한 후 작업반에서 황소를 가지러 오지 않기때문에 오늘은 소달구지를 쓰지 않는것으로 알고 외양간에서 황소를 끌어내여 들판으로 몰고나갔다. 거기에 아직 마르지 않은 풀들이 있었다.
오만수앞에 익은 벼들이 꽉 들어찬 대지가 아득하게 펼쳐져있었다. 사람의 힘이 무섭긴 무섭다. 이 넓은 논을 봄, 여름내 다루어 올해농사가 보기 드물게 잘되였다. 올해는 알곡계획을 수행했다.
아침바람이 일면서 벌판을 휩쓸고 지나가자 이슬에 축축하게 젖은 누런 벼이삭들이 고개를 무겁게 숙인채 흔들리며 물결치듯 했다. 물방울들이 후둑후둑 떨어졌다.
《할아버지, 나오셨습니까?》
인사를 하는 녀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관리위원장 명숙이다.
《예, 논들을 돌아보우?》
이 아침처럼 청신하고 싱싱한 명숙을 보며 오만수는 뜻밖에도 새롭게 느껴지는것이 있어 얼떨떨해졌다. 키가 늘씬하며 검은 눈에 정기가 넘치는 젊은 녀인이 별로 더 돋보이고 믿음직해보였다. 아득히 펼쳐진 논벌이 이 녀인의 지도밑에 무르익는 벼로 꽉 들어찼다는 충동이 밀려왔다.
《할아버지, 어때요? 작황이 좋지요?》
명숙이 시원하게 웃으며 물었다.
《작황이 좋다마다! 더 말할게 없어.》
명숙은 흐뭇해서 물결치는 벼이삭들을 바라보며 오만수에게로 다시 눈길을 돌렸다.
《황소를 맡으셨군요?》
《관리위원장이 맡겨줬지.》
《저 엉치뼈가 언제면 둥그래질가요?》
《봄갈이때 이 오만수가 먹이는 황소를 다시 와서 봐주슈.》
명숙은 명랑하게 웃었다.
(언제보나 인물이 참 잘났어.)
오만수는 어험어험 어색해하며 명숙의 웃는 눈길을 피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