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편소설 별의 세계 36
페이지 정보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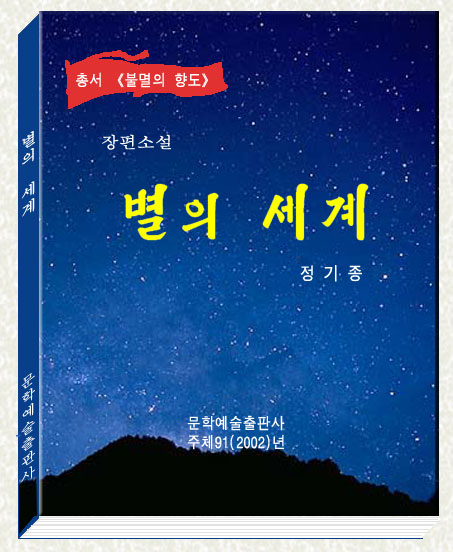
제 7 장
1
1998년 1월 16일 새벽,김정일동지께서 타신 렬차는 북방의 험산계곡을 꿰지르며 달리고있었다. 혹독한 강추위가 대지를 옥죄였다. 별들도 추위에 떨다 못해 좁쌀알처럼 졸아들었다. 지상에서는 눈보라가 아우성쳤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중충하게 솟아있는 시꺼먼 산봉우리들을 내다보고계시였다. 밤하늘을 떠받치고 묵묵히 솟아있는 준령들, 험한 바위츠렁과 눈에 묻힌 계곡들이 언듯언듯 지나가군 했다.
어느덧 렬차는 가파로운 명문고개를 멀리 뒤에 남기고 자강땅 깊숙이 들어섰다.
기적소리가 울렸다. 얼어붙은 산발과 밤하늘을 찢으며 거센 웨침소리를 내지른다. 자강땅사람들이여, 고난의 길, 시련의 길은 아직 멀고 또 멀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고립, 압살책동과 개혁, 개방바람에 들뜬 자들, 온갖 불순분자들의 반혁명적행위로 하여 나라안팎의 정세는 의연히 엄중하다. 하기에 새해 1998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은 강행군길이다. 최후승리를 위한 이 강행군에서 자강도사람들이 우리 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본받아 전국의 앞장에서 나아갈것을 당은 부른다!… 기적소리는 이렇게 웨치고있다. 그이의 심중에 끓는 호소를 되받아 웨치며 어둠을 찢어발기고있다.
다음순간 그이께서는 그에 화답하는 자강도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보시였다.
사람들이 홰불을 들고 마주 달려오고있다. 불꼬리를 날리는 무수한 홰불, 솜모자를 눌러쓴 사람들, 정대와 함마를 멘 청년들, 가두녀맹원들, 학생소년들… 허연 입김을 날리며 어푸러지고 눈속에 딩굴면서도 기를 쓰며 달려온다. 성에 불린 눈섭을 흠칫거리는가 하면 눈물이 즐펀해서 어치정거리는 처녀도 있다. 기름때묻은 솜바지, 꿰여진 로동화, 람루해진 털모자와 목도리… 그래도 그들의 마음은 뜨겁다. 굶어쓰러지면서도 기계를 베고 죽는다던 자강도사람들, 그이의 부르심에 산악같이 떨쳐일어난 사람들, 그들속엔 리수진이도 끼워있을것이다.
리수진을 생각하시자 다시 가슴은 아릿해진다. 방금전 권형일비서로부터 여러가지 보고를 받으시던중 서산옥이 불치의 병으로 끝내 눈을 감았다는것을 아시게 된것이다.
그때김정일동지께서는 서류를 번지시던 손을 멈추고 이윽토록 권형일을 지켜보시기만 하였다. 뜨끔한 충격, 그것은 아픔이였던가, 애잡짤한 분함이였던가?… 전쟁시기 최광의 담당간호장이였던 서산옥, 인제는 투사도 가고 로병도 갔다. 누구도 죽음을 앞질러 가볼수는 없어 인생길의 종착점을 알아맞출수는 없다. 그러나 아까운 사람들이 떠나갈 때마다 그이께서는 비통한 심정을 참기 어려워하시였다.
물론 서산옥은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전쟁로병들중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 남들처럼 소문없이 성실하게 일하였고 자식을 키웠고 이러저러한 곡절로 속을 썩이기도 했다. 불치의 병때문에 침상에 누워있다가 늙은이답게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소원했던것은 무엇이였을가?… 많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키워온 아들의 장래때문에 어혈이 진 마음의 아픔을 그대로 안고갔을것이다. 이제 리수진을 데려가 친아버지 최동환의 영웅적최후를 알려주고 늙은이의 마음도 기쁘게 해주려 하셨는데… 조금 늦었다. 그것이 아쉽고 분하시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아우성쳤다. 멀고 먼 우리 혁명의 길에 눈보라는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의 노래에서도 눈보라는 빠지지 않고있다. 고난과 시련이 많았듯이 눈보라 또한 그칠줄을 모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뽀얗게 날리는 눈가루들을 이윽토록 내다보고계시였다. 한순간 무수한 금빛눈들을 보신듯 했다. 타래치는 눈보라속에서 호흡하듯이 명멸하는 불빛들, 그이께서는 차창유리에 바투 다가서시였다.
깊은 골안에 자리잡은 마을, 온 마을이 불을 켜고있다. 희미한 가스등, 석유등도 아니고 옛 시절을 상기시키는 고콜불도 아니다. 밝은 전기불들이 오손도손 속삭이며 껌벅거리고있다.
어느새 가까와진 산골마을, 어제까지만 해도 썰렁한 부엌에서 가물거리는 등불아래 풀죽을 쑤던 녀인들의 눈물이 소금대신 가마속에 방울지어 떨어지던 산골마을이다. 그 마을이 전등불을 환히 밝히며 마주 오더니 어느새 멀리 사라져간다. 그 하나하나의 불빛들이 그처럼 정답고 소중하고 자랑스러워 그이께서는 전속으로 달리는 기차를 멈춰세우고싶은 심정이시였다.
지난해 자강도당책임비서를 부르시여 로동계급이 집중되여있는 자강도에서 먼저 인민군대와 같이 새로운 시대정신을 홰불처럼 쳐들라고, 중소형발전소건설을 대대적으로 벌리라고 과업을 주시던 때로부터 1년이 지났다. 1년-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럽던 1년, 아픔도 눈물도 많았던 1년, 눈보라는 아우성치나 봄빛만은 지워버리지 못한다. 어느덧 불밝은 도시가 수천수만개의 금빛눈을 빛내이며 마주 오고있다.
눈보라 눈보라 네 아무리 사나워도
가슴에 치솟는 불길은 끄지 못하리라
뜨거움에 젖어드는 그이의 마음속에 이 노래선률이 물결치듯 했다. 그 마음의 분출인듯 또다시 울리는 기적소리, 그 격렬한 웨침에 눈보라도 숙어드는듯 싶었다.
부관을 따라 수행원들이 들어서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 강계에 들어서고있습니다.》
《알고있소.》
그이께서는 여전히 명멸하는 불빛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계시였다. 자정에 평양을 떠나신 그때부터 쉼없이 달려온 800여리의 눈보라길, 비로소 그이께서는 환히 웃고계시였다.
장쾌한 기적소리가 또다시 어둠을 찢으며 새날, 새 아침을 목메여 부르고있었다.
- 이전글장편소설 별의 세계 37 22.11.04
- 다음글[문경환] ‘정권의 종말’과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 22.11.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